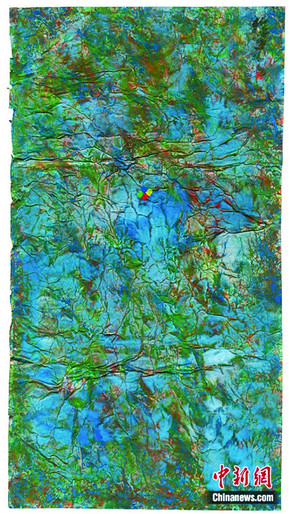[글/마징, 리텅] 말이 캠프이지 사실 베이스캠프는 각 등산탐험대 텐트촌의 집합이다. 에베레스트 남쪽 베이스캠프는 길이 약 2.4킬로미터, 넓이 400미터의 넓은 산자락 지대이다. 정상의 3분의2 지점이지만 유럽의 모든 산봉우리보다 높다.
“누구든 1초 안에 죽는다”
1953년 뉴질랜드탐험가 에드먼드 힐러리(Edmund Hillary)와 재주가 뛰어난 셰르파산악인 단정(丹增)이 네팔 쪽의 에베레스트 남쪽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등정에 성공한 후 이 등산로는 에베레스트등정의 가장 전통적인 노선이 되었다. 1990년대 상업등산사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에베레스트등반노선 역시 탐험에서 격식화되고 날로 성숙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산악인들은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후 10~15일간 기후적응훈련을 통해 산소가 부족하고 추운 고산지대 환경에 신체를 적응시킨다. 일부 산악인들은 이를 ‘아영 훈련’이라 부른다. 훈련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먼저 베이스캠프에서 해발 6,000미터에 있는 1호 캠프까지 등반하고 돌아와 정비한 후 다시 베이스캠프에서 출발해 1호 캠프보다 더 올라가 해발 6,400미터의 2호 캠프까지 등반하고 다시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정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악인들은 등반에 아이젠을 사용해 흔들리는 사다리를 오르면서 균형을 잡는 방법을 익히고 신체도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적혈구를 100만 개 이상 더 생산해 호흡할 때마다 얻게 되는 극소량의 산소를 운반하기 편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신체의 변화와 기능의 적응이 끝나면 가이드가 날씨에 따라 최종 등정일자를 결정한다.
베이스캠프에서 1호 캠프, 2호캠프, 3호캠프, 4호캠프를 거치면 정상이다. 산 전체를 등반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기상조건 역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마지막 등정과정에는 막판 스퍼트의 용기와 추진력이 필요해 ‘정상돌진’이라고도 한다.
등반경로가 격식화 되면서 베이스캠프는 간단한 정비구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촌락처럼 ‘세계의 지붕’ 등정을 사업으로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흩어진 그룹이 되었다. 각 등산대는 이곳에 임시숙소를 세우고 야영 훈련을 이어가면서 이전의 파트너를 만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하며 가끔 다른 사람의 텐트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쉽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2015년 봄 등산시즌 중 중국등산대는 캠프 각지에 흩어져 있다. 여성등산대와 동행하는 남성등산대는 베이스캠프의 중앙에 영국 JG 등산대와 호주의 한 등산대 바로 옆으로 터를 잡았다. 송위바오와 샤보웨이의 텐트는 지대가 낮은 캠프 입구에 가깝다. 리졘훙이 이끄는 ‘실크로드’와 ‘에베레스트 남파등산대’는 베이스캠프의 가장 북쪽에 위치했다.
엄밀히 말하면 베이스캠프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어 남쪽으로 트인 자연원형극장을 방불케 한다. 캠프의 정 북쪽에는 에베레스트등반을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쿰부(Khumbu)빙하가 걸려있다. 쿰부빙하는 얼어있으면서도 언제든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빙하로 높이는 300여미터다.
거대한 크레바스(crevasse)가 기온의 변화에 따라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한다. 산악인들은 현지 셰르파인을 통해서만 빙하를 건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빙산의 의사’로 불리는 알루미늄사다리를 타고 빙하를 건너면 1호 캠프에 도착한다.
세계 제4봉인 로체봉(해발 8,516미터)의 잔여산맥은 동쪽에서 남쪽 베이스캠프를 휘돌며 서쪽의 해발 7,161미터 푸모리(Pumo Ri)봉과 함께 베이스캠프를 둘러싼다. 멀리서 보면 에베레스트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눈과 어두운 줄무늬모양의 암석으로 이뤄진 3면체 피라미드처럼 보이고, 로체봉과 푸모리봉은 가파르게 우뚝 솟은 두 개의 거대한 흰색 대나무 연처럼 보인다. 베이스캠프는 이 세 ‘거인’의 발 아래 자리잡은 조그맣고 평탄한 항구일 뿐이다.
산악인들은 눈사태에 익숙하다. 에베레스트와 같이 높은 산에서는 특히 그렇다. 베이스캠프에 앉아있노라면 경험 있는 산악인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우르르 소리를 듣고 그 곳에 또 눈사태가 일어났음을 판별할 수 있다.
봄은 눈사태가 일어나기 쉬운 계절이다. 기온이 오르면서 산봉우리 표면에 쌓인 눈이 녹은 물이 두꺼운 적설층으로 들어가면 눈이나 얼음덩어리의 응집력이 약해져 눈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지진 역시 눈사태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미국 지질탐사국 홈페이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에베레스트 주변지역에서 강도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여덟 차례로 같은 기간 일어난 같은 강도 지진의 0.4%에 불과했다. 또한, 과거 100년간 강도8 이상의 지진은 2회에 그쳤다.
기상조건에 비해 지진이 눈사태로 이어질 우려는 온도의 변화로 인한 눈사태보다 적다. 따라서 봄철 등산객들은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 기온이 올라가기 전에 가장 위험한 쿰부빙하를 건너 예기치 못한 눈사태를 만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눈사태는 여전히 산악인들이 생명을 잃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2014년 봄 참혹했던 눈사태 후 한 세르파인 가이드는 인터뷰에서 “경험이 얼마나 많든, 누구든 산사태가 일어나면 1초안에 죽는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1921~2006년 에베레스트에서 사망한 192명 중 46명이 눈사태나 얼음붕괴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자ⓒ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최고봉 구원 72시간 (1)2015.05.27
- 최고봉 구원 72시간 (2)2015.05.27
- 최고봉 구원 72시간 (3)2015.05.27
- 최고봉 구원 72시간(4)2015.05.27
- 최고봉 구원 72시간(5)2015.05.27
- 최고봉 구원 72시간(6)2015.05.27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
많이본 기사
- 경제
- 사회
-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