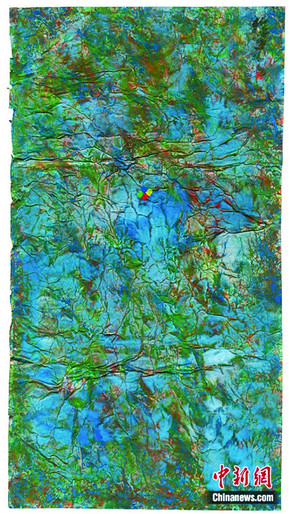|
| ▲ 7월 14일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존홉킨스대학 응용물리실험실. 우주탐사선 ‘뉴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 사진을 보내오자 NASA 직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설명/천쥔단 |
[기자/리텅] 2015년 7월 14일 20시 52분. 미국 메릴랜드주 로럴시 존 홉킨스 대학 응용물리실험실 관제센터가 사람들로 붐볐다. 스크린이 넓지 않은 사무실을 채웠고 사람들은 앉거나 서서 앞에 놓인 모니터를 마음 졸이며 바라보았다.
9년의 기다림 끝에 ‘뉴호라이즌스(New Horizon)호’ 연구팀이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다. 탐사선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관제센터는 21시간동안 외부와의 연락까지 끊었다. 뉴호라이즌스호와 지구와 거리는 50억km. 빛의 속도로 4시간 30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끝없는 우주에서 탐사선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연구팀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
“탐사선 추적에 성공했습니다.” 사업운영매니저(Mission Operation Manager, 이하 ‘MOM’) 앨리스바오만(Alice·Bowman)이 마이크에 대고 밝혔다. 책상 위의 곰 인형 마스코가 그녀가 이 방에서 ‘귀한’ 사람임을 보여준다——사무실에서 ‘뉴호라이즌스 호’의 대체물인 곰 인형은 배례모를 쓰고 왼손에 미국 국기를 들고 바오만의 스크린 옆에 얌전히 앉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 가운데 사진기사들이 직원들의 심각한 표정 하나하나를 적으려 자리를 드나들고 있었다. 힘든 시간을 오래가지 않았고 1분 후 바오만이 “원격측정신호가 추적되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아하——” 관제센터에 있던 모두가 박수를 쳤다. MOM은 무선전기주파수, 항로유도장치, 추진력, 전원, 온도 등 수치가 모두 정상임을 확인한 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다른 끝에 앉아있던 수석과학자 알랜 스턴(Alan Stern)에게 “데이터 수신에 성공했습니다. 탐사선이 양호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정중히 알렸다.
이 말이 떨어지자 스턴이 두 팔을 번적 들고 흥분해 상기된 얼굴로 문 밖에서 뛰어들어와 곰 인형 손에 있던 미국국기를 뽑아 들고 사람들과 뜨겁게 악수하며 포옹했다.
뉴호라이즌스호는 2001년 11월 29일 정식으로 기획되어 9년 전인 2006년 1월 19일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구상에서 발사까지 15년이 걸렸지만 중형체구에 탄탄한 근육, 아이처럼 맑은 눈빛의 뉴호라이즌스호와 많은 팀원들은 힘을 다해 끝없이 펼쳐진 캄캄한 우주를 끊임 없이 날아다니며 명왕성과 마주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9년동안 거의 모든 과학생명을 쏟아 부었다.
X행성
모든 일은 1989년 5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 각지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기나긴 우주발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콜로라도대학 볼더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청년 알랜 스턴이 NASA의 제프 브리그스(Jeff Briggs) 행성탐사매니저를 만났다. 왜 명왕성 탐사사업은 하지 않느냐는 알랜의 물음에 제프는 이제까지 제안한 사람이 없었다고 대답하면서 ‘근사한 사업처럼 들리는데 함께 해 보겠나?’라고 제안했다.
당시 명왕성이 발견된 지 70년이 지났으면서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명왕성탐사에 관심이 없었다.
1930년 클라이드 톰보(Clyde Tombaugh)라는 24세 청년이 새로운 천문관측기구와 비범한 세심함으로 다른 은하계의 사진을 비교해 태양에서 매우 먼 곳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행성 하나를 발견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발견이었다. 1846년 태양계의 가장 먼 행성이 해왕성이라 확정 된 후 84년동안 많은 천문학자들이 천왕성과 그 궤도를 계산해 명왕성 밖에 행성 하나가 더 있음을 발견했다.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은 ‘X행성’이라 이름까지 붙였다. 안타깝게도 이 행성은 시종일관 관측되지 않았다.
11살 영국소녀의 제안에 따라 이 행성은 ‘명왕성(Pluto)’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Pluto’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어둠이 신으로 자신을 숨길 수 있어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렵다는 전설이 있다.
이렇게 명왕성은 해왕성 대신 태양계의 가장 먼 곳에 있는 행성으로 생각되면서도 명왕성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여기에 그쳤다.
사실 알랜이 NASA의 행성과학부 매니저를 만난 그날 미국 탐사선 ‘보이저(Voyager)’2호가 외태양계 탐사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 해 8월 25일 보이저 2호는 해왕성으로 날아가 선명한 트리톤사진을 찍어 보내왔다. 보이저 2호는 해왕성에 간 ‘김에’ 명왕성까지 들를 수 있었으나 당시 사업을 주관하던 과학자들이 명왕성에 관심이 없어 항로조정 없이 바로 발사했다.
알랜도 자신이 명왕성에 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NASA가 2015년 발표한 다큐멘터리 <명왕성의 해(冥王星之年)>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며 “이후 계속 심취했다.”고 회고했다.
다행히 명왕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알랜 뿐만이 아니었다. 1990년대까지 행성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많은 우주탐사기술을 통해 우주의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되었고, 미지의 우주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젊은이들이 모여 태양계 탐사의 새로운 경계가 어디일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보이저 2호 사업이 끝난 후 그 답은 명왕성으로 모아졌다.
<명왕성의 해>에서 팀의 원로멤버 마크 부이(Marc Buie)는 “명왕성이 그 곳에 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동기였다.”고 회고하면서 “우리가 명왕성에 대해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알랜 스턴, 마크 부이 등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명왕성탐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 젊은 청년과학자들의 모임은 훗날 ‘지하명왕성당’으로 불리며 10여년 후 ‘뉴호라이즌스호’ 프로젝트를 탄생시킨 핵심조직이 되었다.
[저작권자ⓒ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명왕성에 가다 “내 평생 한번뿐인 기회”2015.08.28
- 태양계의 고고학 명왕성탐사2015.08.28
- 명왕성 탐사, 단독 도전에서 연합으로2015.08.28
- 명왕성 탐사, 어려운 출항2015.08.28
- 길었던 명황성 탐사 9년간의 여정2015.08.28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
많이본 기사
- 경제
- 사회
-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