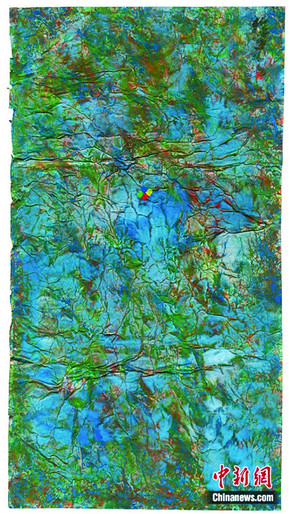‘디지털’이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 사람의 기억은 주로 뇌의 ‘해마체’가 담당하며, 기억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면 해마체가 축소되어 기억용량이 감소하고 인지능력이 낮아진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디지털제품의 사용이 대뇌의 손상을 일으킨다는 어떠한 의학적인 증거도 없다. 실제로 망각은 기억 자체의 특성으로 생활방식과 관계가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검색시대’에 기억력이 여전히 그렇게 중요할까?
-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08-31 10:42:23
[글/뤄위안지에]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휴대폰 전화번호부의 전화번호 중에 몇 개나 기억할 수 있는가? 어제 점심은 누구와 무엇을 먹었는가? 건강검진 예약 날짜가 다음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글의 작가는 누구였는가? 사장이 방금 지시한 세가지 일은 무엇인가? 10초 이상이 지나도 이러한 질문의 답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쩌면 현재 의학적으로는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 ‘병’——‘디지털 치매’ 인지도 모른다.
‘디지털치매’라는 병?
‘뇌균형센터’는 최근 한국에서 빠르게 성정하고 있는 산업으로 과도한 뇌, 휴대폰사용으로 ‘인지문제’가 나타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은 작은 문제에 과민 반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KT경제경영연구소의 최신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4위로 초등학생까지 6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사회는 과학기술이 젊은 세대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뇌균형센터의 전문가들은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뇌의 균형 있는 발달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중도수준의 전자기기 사용자는 좌뇌가 발달하고 우뇌사용률이 낮아진다. 우뇌는 집중력, 기억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뇌의 발달이 장기적으로 저하되면 조기성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
| ▲ 다양한 우수인재들의 직업선택과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요구와 인재의 정의를 보면 ‘정보검색·통합능력’이 항상 키워드로 가장먼저 등장한다. 그림/GETTY |
더불어 전문가들은 과도한 전자기기사용으로 인한 인지장애현상을 ‘디지털 치매’라는 새로운 명사로 정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증상의 중요한 원인이 우리가 자신의 기억력을 남김 없이 전자메모리장치와 디지털제품에 ‘위탁’한 데 있다고 본다.
일반으로 기억력감퇴와 학습능력저하는 노인들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증상이 청년들 사이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추세기계조사센터(趋势机器全国调查中心)의 통계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18~34세 사람들이 55세이상의 사람들보다 요일(15%:7%), 열쇠를 둔 장소(14%:8%), 도시락 챙기기(9%:3%), 씻기(6%:2%) 등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에 비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이름(23%:16%)’ 뿐이었다.
18~34세의 젊은이들은 ‘밀레니엄세대’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전자과학기술과 인터넷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성장한 전자설비의 주요(그리고 잦은)사용자들이다. 조사에서 이들은 자주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이 역시 디지털치매의 증상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이 성립된다면 최근 18세이하 청소년들의 전자기기사용률이 크게 상승한 것은 더욱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과학부 ICT와 미래기획국 통계에 따르면 10~19세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1년 21.4%에서 2015년 64%로 급증하였으며, 이들 중 스마트폰의 평균사용시간이 7시간을 넘어서는 경우도 2014년 11.4%에서 18.4%로 증가하였다. 한국 뇌균형센터는 아동의 경우 대뇌발육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자기기를 장시간 자주 사용하는 것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학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기억은 주로 뇌의 ‘해마체’가 담당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수축되듯이 기억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면 해마체가 축소되어 기억용량이 감소하고 인지능력이 낮아진다. 독일 뇌 과학자 만프레드 슈피처(Manfred Spitzer)는 2012년 출판된 그의 저서 <디지털치매>에서 디지털치매의 가장 직접적인 예는 ‘네비게이션으로 길을 찾고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저장시켜 정신활동을 이용, 통제하는 능력이 퇴보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슈피처박사의 태도는 분명하다. 그는 독일 모든 어린이들의 전자매개접촉을 금지해 중독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기기가 대뇌의 균형 있는 발달에 백해무익하며 대뇌의 인지기능은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러나 독일의 뇌신경학박사 마이클 마드겔(Michel Madgel)에 따르면 ‘디지털치매’는 시장에 발맞춰 만들어진 말이다. 청소년의 경우 사춘기에 대뇌활동이 매우 활발한데, 과학자들은 최근에야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전자제품사용이 뇌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는 “오늘날까지 디지털제품의 사용이 대뇌의 손상,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일으킨다는 어떠한 의학적인 증거도 없다.”고 강조한다.
설명에 따르면 많은 연구로 증명된 유일한 사실은 전자스크린이 저연령아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많은 정보들이 빠르게 전환되는 스크린을 보면 대뇌처리기능이 약한 아동들의 뇌 발육에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 물론 <세사미 스트리트(Sesame Street)>를 보면 어휘 량과 숫자계산능력이 향상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저작권자ⓒ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디지털’이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2015.08.31
- 디지털시대 기억력은 어디에?2015.08.31
- ‘검색시대’, 아직도 기억력이 필요한 사람은?2015.08.31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
많이본 기사
- 경제
- 사회
-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