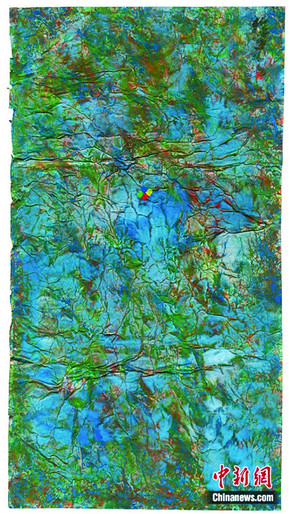티베트의 50년 II
- 티베트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중앙선 위에 위치하며 크게 나취지구(那曲地区), 라싸시(拉萨市), 산난지구(山南地区)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라싸는 지치구의 정부소재지로 장족(藏族)사람들 마음의 ‘성역’이며, 나머지 두 지역에는 티베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목축민과 농민이 분포되어 있다.
50년간 이들은 각기 다른 발전과정을 겪으며 최종적으로 티베트50년 변천의 윤곽을 만들어냈다. -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11-05 10:05:32
 |
| ▲ 2015년 8월 16일. 티베트 현지주민. 촬영/조우빈 |
칭짱철도가 가져온 새로운 사업기회
마을 북쪽으로 칭짱철도 레일이 깔릴 때 목축민들은 이것이 새로운 활로임을 어렴풋이 알았다.
철도를 세우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칭짱철도, 칭짱도로 인근 나취진의 청장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구성해 건설현장으로 일을 나갔다. 먼바(门巴)는 이들의 대표로 대충 계산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10만위안 정도로 외지에서 배달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2006년 7월 1일 칭짱철도가 개통되었다. 동쪽 시닝(西宁)에서 출발해 거얼무(格尔木), 퉈퉈허(沱沱河)를 지나 탕구라산(唐古拉山)을 넘어 티베트에 들어와 남쪽 라싸에서 멈춘다.
티베트여행객들은 고산반응을 줄이기 위해 이 열차를 이용한다. 나취는 티베트에 진입한 후의 가장 큰 역으로 평균 해발 4,500m 이상이며 광활한 초원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다.
가마상단 집에서 10km 거리인 부뤄부(布罗布)는 재빨리 활로를 찾았다.
짱베이(藏北)는 목축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젖 생산량 역시 풍부해졌다. 목축농가들은 집집마다 흔한 젖소와 요구르트가 초원 외의 지역에서는 인기상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들의 집에서 먹을 유제품을 만들고 남은 젖들은 모두 버려버렸다.
2005년 칭짱철도가 개통되기 전 나취현은 ‘도로·철도인근지역경제벨트’ 건설을 제안했다. 마을 임원이 목축민협력경제조합 설립과 유제품 판매에 부뤄부를 찾고, 정부는 상가와 창고,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부뤄부의 발상은 철도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이끄는 목축민협력경제조합은 ‘창뉴(羌牛)’라는 브랜드의 유제품을 등록해 칭짱도로변이나 칭짱열차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했다.
야크 젖을 발효시켜 만든 요구르트는 훗날 내륙에서 유행한 일반요구르트와 전혀 다르다. 야크 요구르트는 표면에 노란 크바르크가 생겨있어 보기에도 신선하고 맛도 깔끔하면서 진하다. 내륙 여행객들은 이런 원상태의 요구르트를 보면 감동하고 신기해하며 너도나도 한 병씩 사간다.
매출이 매우 좋았다. 기차까지 편리하게 배달하기 위해 부뤄부는 나취역 부근에 수 백만 위안을 투자해 요구르트공장을 세웠다. 요구르트와 함께 버터, 우유과자(奶糕), 치즈 등 다른 유제품도 가공하기 시작했다.
현재 부뤄부의 목축민협력경제조합에 가입한 가정은 386가구 1,933명에 달하며, 요구르트만 매일 200~300근(약 10만~15만g)이 팔리고 그 중 3분의2는 기차 승객들에게 팔려 하루 수입이 6천위안을 넘는다.
가마상단은 이 활로가 부뤄부보다 몇 년 늦었음을 알았다.
2009년 초원의 눈사태로 나취지구의 가축 8만여마리가 죽었다. 가마상단 집 역시 500마리의 소와 양 가운데 60마리를 순식간에 잃었다.
겨울이면 집집마다 요구르트를 먹는데, 도시주민들은 목축지에 사는 친척이 있으면 요구르트를 받아 먹을 수 있었지만 그 해에는 요구르트가 매우 적었다.
가마상단은 배달차를 몰고 자기 집의 요구르트를 끌고 나취지구에 팔았다. 순식간에 동이 났다. 친인척들로부터 젖을 사도 수요를 맞출 수가 없었다. 후에는 마을 전체 40~50가구의 젖을 모두 긁어 모았다.
그는 이것이 사업의 기회라 생각해 ‘농·목축민협력경제조합’을 설립해 주변의 목축농가 130여가구와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젖, 야크 또는 초장을 제공했다. 이렇게 현지시가보다 조금 높은 근(500g)당 8위안에 사 자체가공을 한 후 근당 12위안의 가격에 팔았다. 젖 생산량이 많지 않은 겨울에는 사는 가격이 근당 30위안까지 뛰어 요구르트가격도 함께 올랐다.
1년동안 농·목축민협력경제조합은 100만위안 정도를 벌었고 자신이 20~30만위안을 가졌다. 배달수입의 2~3배였다.
먼바 역시 유제품가공사업 생각이 생겼지만 마을의 건축사업 역시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채석장을 열고 시공 팀을 조직해 농·목축민협력경제조합을 설립했다. 현(县)과 지역에 주택건축이 착공되면 시공 팀과 함께 찾아가 사업을 수주 받았다.
수입증가속도가 칭짱철도 시공 때보다 훨씬 빨랐다. 연말 조합은 300만위안의 수입을 달성했다.
이는 자치구의 전 지역 생산총액 증가로 이어졌다. 2005년부터 자치구 전 지역의 생산총액은 300역, 400억, 500억위안을 차례로 넘어섰다.
최근 나취지구 전체의 농·목축민협력경제조합은 487개에 달하며 1만7천5백가구와 8만8천1백명이 포함된다.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수오랑바단은 그 이후 자신의 집에도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다.
2010년 그들은 3,078무(亩)의 초장에 집을 새로 지었다. 흰 벽에 유리창, 넓은 방이 있는 전형적인 티베트식 주택 거실에 TCL TV, 후지 카메라, 블루레이 DVD를 놓았다.
집은 북쪽에 터를 둔 남향으로 문 앞에는 61년동안 차가 다니고 있는 칭짱고속도로가 있고, 집 뒤로는 멀지 않은 곳에 9년동안 매일 수 차례의 직행열차가 지나가는 칭짱철도가 있다.
승려도 국민이다
49세의 승려 아왕췬쩡(阿旺群增)이 라싸시의 드레펑사원(哲蚌寺) 앞에 서있다.
‘드레펑(哲蚌)’은 티베트어를 음역한 것으로 ‘쌀 더미’ 라는 뜻이다. 멀리서 보면 흰 색의 뜰이 모여있는 것이 쌀 더미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라마불교 거루파(格鲁派, 황교)의 3대서원 중 하나인 드레펑사원은 거루파의 창시자 총카파(宗喀巴)대사의 제자가 1416년에 지은 사원으로 내년이면 600년이 된다.
아왕췬쩡은 361° 신발을 신고 손에 등 최신형 iPhone6 에는 가사색깔과 비슷한 빨강색 휴대폰케이스가 쓰여져 있다. 휴대폰 벨이 울리자 등을 돌려 티베트어로 전화를 받는다. 얼마 후 몸을 덜려 유창한 중국어(표준어)로 사원을 찾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는 올해로 드레펑사원에 온지 24년째이다.
1982년 17세이던 아왕췬쩡은 이제 막 개원한 티베트 불교학원에 입학한다. 1991년 졸업 후 드레펑사원 경전학고급반(学经高班)에 들어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1996년 6월, 자치구 당위원회가 전 지역의 사원을 대상으로 애국주의교육을 시행하면서 달라이마세력의 영향력을 없애고 승려들의 현황을 파악하며, 민주관리위원회를 정리하는 한편 규정을 마련했다. 전 지역의 영향력 있는 사원 150곳을 시범 삼아 임원 1,255명을 차출하고 141개의 업무 팀을 구성해 사원에 투입시켜 업무를 진행했다. 라싸시의 3대사원——드레펑사원, 세라사원, 간덴사원이 중점이었다.
3대사원의 승려 수도 드레펑사원 700명, 세라사원 500명, 간덴사원 300명으로 제한되었다. 아왕췬쩡은 각 사원 민주관리위원회의 재선거에서 애국·애겨승려로 선출되어 드레펑사원 민관회(民管会)로 들어가면서 경전공부를 그만두었다.
민관회와 업무 팀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뚜렷하지 않다.
드레펑사원의 경전 반에는 200여 명의 승려가 있었다. 이들은 대표 팀을 자천해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결정했다. 그 시절 민관회와 업무 조의 발언권은 크지 않았다.
2008년 3월 14일 티베트에서 때리고 부수고 약탈하고 불태우는 폭력범죄사건이 발생해 무고한 시민 382명이 다치고 18명이 사망하고 공안경찰, 무장경찰장병 241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 또한, 거리의 가게 848개, 학교 7개, 주택 120체, 병원 6곳이 파손되어 3억위안 이상의 직접재산손실이 발생했다.
사원은 달라이라마 세력이 ‘티베트독립’사상을 침투시키는 중요한 곳이었다. 2009년 자치구는 <건전한 라마불교사원 관리를 위한 장기간 효력 있는 체제마련에 관한 의견(关于建立健全藏传佛教寺庙管理长效机制的意见)>을 발표하고 2년후 <사원관리 강화 및 혁신에 관한 중국공산당 티베트자치구위원회와 티베트자치구 인민정부의 결정(中共西藏自治区委员会、西藏自治区人民政府关于加强和创新寺庙管理的决定)>을 시행했다.
그 후 티베트의 모든 사원 관리체제가 ‘사원관리위원회’로 통일되고 당 임원이 파견되어 사원에 상주했다.
뤄부(洛布)는 2008년 드레펑사원에 들어와 2011년 드레펑사원 관리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25명의관리위원 중 13명은 사원 상주임원, 12명은 애국·애교승려였다. 아왕췬쩡 역시 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상무 부 주임을 맡았다.
관리위원회 밑에는 불사관리, 문물, 자산경영관리, 치안 등 여섯 개의 처(处)가 있었다.
그들의 업무는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기존의 민관회는 위신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승려들 역시 임원들도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사원의 재산권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임원들의 상주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우려를 점차 불식시키는 것은 상주임원이 정부와 접촉하는 능력이었다.
드레펑사원은 문화대혁명기간에 심하게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해 동안 보수도 많이 진행하지않았다. 2010년 정부는 7,000여만위안을 투입해 대전, 경전공부를 하는 별관, 창고 등 드레펑사원의 건물들을 수리했다. 그 후 5년동안 여러 차례 총 3억위안의 자금을 지급해 배수, 소방 등 시설을 마련했다.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아왕췬쩡은 민관회 단계에서 그들은 정부부처에 경비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어떻게 접촉해야 할지 몰라 번번히 좌절되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상주임원 중에 티베트족사람이 많기는 했으나 그들 자신도 공상당원으로서 정부시스템에서 몇 년을 일해 규칙을 잘 알고 경비신청과 심사·허가의 효율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이밖에 과거에는 사원에 명세 분류장이 없어 매년 모든 승려들에게 총 수입과 총 지출을 통보했는데, 임원이 상주한 후 재무내역을 정확히 다뤄 6개월마다 모든 승려들에게 각 항목의 수입과 지출을 통보했다.
자치구의 사원들은 ‘사원으로 사원을 부양하는(以寺养寺)’ 방침을 시행했다. 드레펑사원의 수입은시주를 통한 보시와 입장료, 자체 경영하는 목장, 차량, 차관, 상점 등을 포함한 경영수입 두 종류가 있는데, 이들 수입은 세금이나 상납 없이 전액 사원운영에 사용되었다.
드레펑사원 승려의 수입 역시 시주된 보시와 노동점수에 따른 수입 두 종류로 나뉜다. 이는 관리위원회가 설립된 후 추진한 새로운 방법으로 승려들이 각자의 직무에서 노동을 통해 매달 고정적으로 채워야 할 점수를 받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드레펑사원 재직승려들은 연간 대략 7만위안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
재정의 투명화로 재산권융통에 관한 의심이 점차 사라졌다. 이와 더불어 관리위원화는 사원에서 자신의 업무를 하나씩 수행해 나갔다.
드레펑사원의 편성은 만원이 되지 않았다. 현재 총 500명의 승려가 있는데, 관리위원회는 이들을거주상황에 따라 상주임원, 사원 옆 소방부대, 파출소 치안인원으로 구성된 열 개의 법제선전교육 팀으로 나누었다.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매주 한번 이상 교류회를 열고 세 번 이상 사원을 순찰했다. 매주 두 번 10개의 포교 팀과 교류회를 가지며, 매달 전 사원의 승려들과 상주임원이 학습대회를 열어 관련정책방침과 법률법규를 홍보하고 그 달의 상황을 통보, 점검했다. 관리위원회는 매년 모든 승려의 가정에 위문편지를 보내며 그 해의 업무상황을 소개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제시했다.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뤄부는 상주임원들은 저마다 짝이 있어 스님 몇 명과 친구가 되어 그들 생활의 어려움과 생각의 변화를 바로 파악했다고 소개했다.
‘승려도 국민이다’라는 표준에 따라 재적스님들은 일년에 한번 무료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관리부’를 작성했다. 또한,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양로보험, 최저생활보험을 들었다.
뤄부의 말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는 ‘정치적인 평등과 신앙적인 존중, 사람중심’을 표방했다고 한다.
현재 자치구의 임원 7,400여명이 1,316개 사찰에 관리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전 지역의 1,787개 사원이 모두 사원관리시스템에 포함되었다.
iPhone, 내 집 마련, 공무원
산난 궁가공항에서 라싸 시내 쪽으로 걷다 보면 류우신구(柳梧新区)의 도로 양 옆으로 건물과 쇼핑광장이 지어지고 있다. 청관구(城关区)에 들어서면 양쪽으로 1층과 2층을 가게로 꾸민 나지막한 옛날 집들이 이어진다.
식당들은 쓰촨(四川)요리, 후난(湖南)요리, 티베트요리 집이 주류를 이루고 도시에는 아웃도어스포츠브랜드와 오쉬리(Ochirly) 여성복이 가까이에 있으며, 거리의 가게에서는 왕리훙(王力宏) 2004년 앨범 <마음의 시간(心中的日月)>이 흘러나온다. 동충하초와 야크고기 같은 특산품 전문점이 아니면 이 도시는 구매력 중등 수준의 발전 중인 모든 내륙도시와 똑같을 것이다.
특히 비슷한 것은 부동산광고다. 다세대주택, 아름다운 인테리어, 중·저층 등 내륙도시의 건물광고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용어들이 라싸에도 등장한다.
라싸의 부동산광고는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다. 주택가격이 서서히 올라 2008년 시내 중심의 주택가격은 1m2당 4,000위안이 되었다.
2008넌 ‘3·14’사건 이후 티베트는 침체기를 겪었다. 내륙여행객들이 줄고 부동산가격 임대료가 떨어지고 구매력이 낮아졌다.
2011년, 자치구는 도시에 편리·치안시설을 설립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라싸에 156개의시설을 설치하고 가장 멀리는 500m, 가장 가깝게는 15m 거리로 시설이 설치해 도시의 네크워크화 관리를 진행했다.
도시의 원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2012년, 가마상단 집안은 라싸 서라베이루(的色拉北路)에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45만위안을 들여205m2 의 집을 샀다.
짱베이는 해발고도가 높고 겨울이 춥다. 집을 일으키고 돈을 번 농·목축민들은 라싸에 집을 사 여름에는 목축지에서 생활하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 라싸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집안의 다섯 아이들도 마침내 각자의 방이 생겼다.
바로 그 해 iPhone이 티베트에 보급되었다. 티베트문자가 지원되는 유일한 휴대폰이기도 하다.
뤄상단쩡(落桑旦增)은 산난지역 간뎬궈린사(甘典曲果林寺)의 승려이다. 11명의 스님이 전부인 작은사원이다. 이 90년대생 승려의 가장 큰 취미거리는 부모님이 사주신 iPhone6로 인터넷을 하는 것이다. 그의 위쳇(微信, WeChat) 친구에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도 있고 스님도 있다. 위쳇을 통해 불교에 관한 글을 공유한다.
드레펑사원의 젊은 스님들은 iPad와 컴퓨터로 불경을 배우고 PPT를 만든다. 49세의 아왕췬쩡은 최신형 iPhone6를 쓰면서도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휴대폰에 깔려 있던 APPLE 프로그램 외에 다운받은 것은 티베트어사전 App 하나뿐이다.
전자제품이 보급되면서 드레펑사원에는 ‘법회나 경전공부 및 토론기간에는 휴대폰을 켤 수 없다’는 새로운 특별규정이 생겼다. 나이 든 스님들은 젊은 스님들이 새로운 물건에 정신을 빼앗겨 속세를 버리지 못할까 걱정한다.
수오랑바단은 2013년 iPhone5를 샀다. 아버지 가마상단이 목축지에서는 iPhone의 신호가 좋지 않아 중국산 브랜드 샤오미(小米)를 사면 잘못하면 시대의 흐름에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티베트대학 사범학과를 졸업한 후 수오랑바단은 내륙도시로 나가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나취지구로 돌아와 녜룽(聂荣)현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다.
학교는 당시 랴오양에서 학교를 다니며 보았던 내륙도시의 학교와 별 다른 바 없이 타틴트랙, 실내농구장, 멀티미디어실 까지 있었다.
학교에는 200여명의 학생과 20여명의 교직원이 있었다. 수오랑바단은 티베트어와 수학을 가르쳤는데, 중국어(표준어) 담당교사도 있었고 모든 학생들은 1학년과정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내륙지역에서 티베트 반에 다니는 것이 유행하고 있으며 점수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산난지역 교육국위원회 당서기 차이셔우콴(采守宽)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초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5%가 내륙 티베트 반에 진학하며, 정원 194명중 농·목축민의 자녀가 70%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학생들은 외지로 나가 내륙지역에서 공부하고 진학하면서도 그곳에 남아 일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차이셔우콴은 99%정도의 학생이 티베트로 돌아온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공무원시험은 제일 매력적인 진로이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도시생활, 안정적인 일, 점점 올라가는 임금과 대우 등의 이유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그럴듯하다 생각하는 직업이다.
니마츠런(尼玛次仁)은 커쑹촌에서 18년동안 당 지부 서기로 있었지만 그의 아들은 비슷한 길을 가지 않았다. 후손들의 말에 따르면 니마츠런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더 좋고 더 많은 기회를 주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식들이 커쑹촌에 남아 농사를 짓고 있다.
수오랑바단은 남동생과 여동생 세 명이 있다. 이란성쌍둥이인 남동생과 여동생은 올해 24세로 각각 티베트대학 간호학과와 티베트 경찰고등전문대학을 졸업했다. 막내 남동생은 22세로 쓰촨 민족대학을 졸업했다.
올해 동생들은 나취지구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다. 8월초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세 명 모두 합격해 최종발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50세가 넘은 가마상단은 걱정이 없다. 그의 자식은 자신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지식이 있고 체제 안에 들었으니 기후에 의지해 동분서주하며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수오랑바단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라싸에 집을 사고 싶지만 라싸시 중심지의 집값은 1m2당 1만위안을 넘는다.
높은 집값은 내륙 1, 2급도시 젊은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자 가마상단 집안의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
많이본 기사
- 경제
- 사회
-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