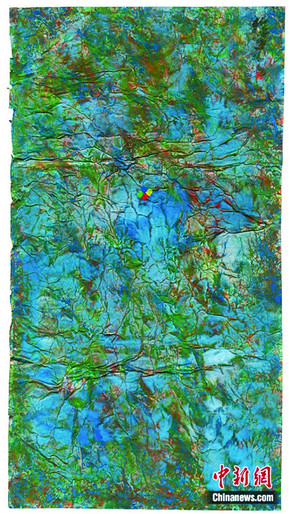지카연구, 의학의 ‘빅테크놀로지시대’를 열다
- 미국 위스콘신대학 메디슨캠퍼스 바이러스학자 데이비드 코너(David O'Connor) 등이 먼저 인터넷에 지카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붉은털원숭이 동물실험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물의학이 ‘빅테크놀로지시대’의 문턱을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중국 연구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카바이러스의 예방·치료 및 연구를 통한 과학기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6-04-04 10:01:55
글/장톈칸(张田勘)
학자, 전문언론인,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生命存在的理由)> 증 저술
최근 미국 위스콘신대학 메디슨캠퍼스 바이러스학자 데이비드 코너(David O'Connor) 연구팀이 지카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원숭이로 실험을 하고 인터넷에 1차데이터를 발표했다. 이로서 정기학술지에만 연구결과를 발표하던 기존의 전통방법이 바뀌었다.
연구팀은 2월 15일 지카바이러스를 인도 붉은털원숭이 세 마리에 주사한 후 진행한 혈액, 타액, 소변검사 바이러스의 1차데이터를 발표했다. 데이터는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매일 새로운 연구결과로 업데이트된다.
과학기술이 ‘빅테크놀로지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빅테크놀로지시대’라는 표현은 빅데이터, 자원공유 및 많은 교차학과, 사양학과, 수평적 과학기술과 종합과학기술의 발생과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원공유를 특징으로 평가하면 빅테크놀로지는 생물의학과 다른 학과를 막론하고 개념적인 것일 뿐 현실적인 빅테크놀로지가 될 수 없다. 공유되지 못하는 자원과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다. 보통 과학자들은 각자 분투하며 자신의 연구성과를 지키기 위해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는다.
데이비드 코너 연구팀이 먼저 인터넷에 지카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붉은털원숭이 동물실험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물의학이 ‘빅테크놀로지시대’의 문턱을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중국 연구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카바이러스의 예방·치료 및 연구를 통한 과학기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질병통제센터(CDC)는 저장(浙江)질병통제센터, 군사의학과학원 등 기관과의 협력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사례 혈액 및 소변 샘플의 바이러스 DNA를 전면 해석해 바이러스 전체의 DNA를 배열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발표했다.
이 같은 과학연구자원 공유방법은 지카병(소두증)의 경과와 원리를 이해하고 약물과 백신을 연구, 개발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곳에서 온 지카바이러스를 알아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약물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중국질병통제센터가 장시질병통제센터와의 협력으로 배열한 10,676개의 지카바이러스 DNA 염기서열은 현재 미주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변종과의 상동성이 높다. 그러나 저장질병통제센터가 배열한 지카바이러스 핵산서열은 태평양 섬나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의 DNA 서열과는 상동성이 높으나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수입병례 바이러스의 핵산서열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 미국의 연구팀이 붉은털원숭이 시험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지카병은 매우 긴급한 공공보건 돌발사건으로 모두가 지카바이러스, 그리고 시간과 경주하고 있다. 과학자간의 경쟁에 따른 보안으로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인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들은 인체연구가 많은 윤리적인 제약으로 상응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동물연구가 이런 긴급 공공보건 상황과 관계된 연구에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사람과 붉은털원숭이 체내에서 지카바이러스의 감염형식과 메커니즘이 비슷해 연구팀은 각각 다른 량의 지카바이러스를 붉은털원숭이에게 주사해 지카병에 대한 가치 있는 첫 번째 관련정보를 얻었다. 과학자들은 임신한 붉은털원숭이 체내의 양수에서 반복해서 샘플을 추출해 태아의 지카바이러스 감염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들 데이터는 인체에서는 빠르고 윤리에 맞게 얻을 수 없고 간접적인 다른 관찰, 연구방식으로는 지카바이러스가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지를 아는 것이 늦어질 수 있다.
붉은털원숭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얻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게 되면 지카바이러스가 소두증과 관련이 있다는 등의 정확한 정보와 메커니즘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가령, 태아가 언제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질병예방에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실험, 특히 영장류를 이용한 의학실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독일과 같은 일부 유럽국가는 영장류동물을 대상으로 한 의학실험을 줄였으며, 미국국립보건원(NIH) 역시 산하 실험실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원숭이실험을 끝내기로 결정하고 고릴라를 침해하는 실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스콘신대학의 연구팀이 지카바이러스에 감염시킨 원숭이 실험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더욱 의미 있어 보인다. 이 같은 자원공유방식을 통해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연구팀도 동물실험결과를 직접 알 수 있고 이로써 의학실험에 사용되는 영장류동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빅테크놀로지시대의 자원공유에 대한 우려도 생겨날 것이다. 그 핵심은 연구성과의 범위와 소재, 그리고 다른 연구원들이 인터넷에 발표된 동물 및 기타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삼을지 여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발표한 시기를 근거로 연구결과를 처음 발표한 시간과 인물을 조만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공개된 연구결과가 근거로 활용될 지의 여부는 빅테크놀로지시대의 발전과 함께 실천이 답해줄 것이다. 어찌됐든 연구결과가 인터넷에 발표되어 공개자료가 되면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은 다양해질 뿐 반대는 아닐 것이다.
[저작권자ⓒ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
많이본 기사
- 경제
- 사회
-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