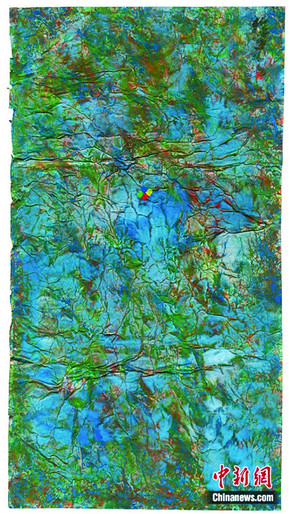중국 자동차, 1.0시대에서 3.0시대로
- 시장구조조정과 함께 이제 막 걸음을 땐 중국 자동차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04-24 09:46:14
[글/둥먼졘난] 쉬딩자오(许丁浩)는 수 십 년 간 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로 일하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가장 더운 여름에 각종 신차(新车)의 성능시험과 내구성 실험을 할 때는 부러움의 시선이 더욱 커진다.
그는 매년 30만km 시승 후 중국 유명 자동차업체에 신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중국자동차는 합자가 많은데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신차들은 합자자동차를 거의 따라잡은 상태죠.”
이러한 평가는 관련업계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입 소문이기도 하다. 전에 없던 현상이다.
중국 자동차가 이러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 전, 30년 전만 해도 중국 자동차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
| ▲ 1956년 8월 21일, 제일자동차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38대 지에팡(解放) 브랜드 자동차가 베이징에 운송되어 수도 국경절에 검열과 퍼레이드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
중국 자동차 1.0시대:수공업제조시대
중국 자동차는 한국 보다 시작은 빨랐으나 우여곡절을 겪으며 본토시장에서의 발전이 늦어졌다.
중국 건국 후 마오저둥(毛泽东)은 “책상과 의자 외에 중국이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동차 한 대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얼마 후 창춘제일자동차공장(长春第一汽车制造厂)에서 중국 최초의 자동차 ‘지에팡(解放)’ 12대를 생산하면서 중국이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던 시절이 막을 내렸다. ‘지에팡’ 이후 중국 최초의 승용차 ‘둥펑(东风)’과 고급승용차 ‘홍치(红旗)’ 등 중국 자동차공업 발전초기의 상징적인 자동차들의 생산이 이어졌다.
차량출시 측면에서는 당시 중국 자동차공업은 선두를 따라잡고 있었으며 모방한 차랑 역시 당시의 ‘경전’으로 통한다. ‘지에팡’은 명목상 구소련의 기스(Geese)150 이었으나 실제로는 미국 인터내셔널 트럭(International Truck)의 복사판이었고, 중국 최초의 승용차 ‘둥펑’의 경우 엔진과 바닥 판은 벤즈(Benz)190, 차제구조는 프랑스 심카(Simca)의 SimcaVedette를 모방해 만들었다. 중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전형적이고 큰 영향력을 미친 이러한 자동차들은 베이징(北京) 남4환(南四环) 도로에 위치한 자동차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수십 년 간은 제일자동차(一汽, 이치), 둥펑(东风), 상하이자동차(上汽, 상치)로 대표되는 중국 자동차는 어려움이 이어진다.
중국 최초의 승용차 ‘둥펑’과 제일자동차의 ‘지에팡’ 으로 부터 훗날 ‘홍치’와 ‘상하이(上海)’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동차공업은 망치로 두드리는 판금공업 수준의 1.0시대 수공업제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갖가지 문제점들과 함께 길가에 차가 멈추는 문제가 수시로 발생해 지도자가 탔던 업무용 차량이 고장으로 길가에 멈추기도 했다.
이 시기의 중국 자동차공업은 모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금, 기술, 시장 할 것 없는 총체적 난국으로 발전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당시 ‘홍치’한 대의 값이 6~20여만 위안 이었는데 계획경제시기 정부의 자동차 구매가격은 5만 위안도 되지 않았다. 1981년까지 제일자동차는 ‘홍치’를 1492대 판매하고도 6천만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자동차의 1.0시대에는 중국 자동차역사의 보물로 대서특필 될 만 한 특색 있는 차량이 대거 출현하긴 했으나 산업발전의 측면에의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다. 수공업모방 방식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홍치’ 등 고급승용차가 제조되긴 했으나 부품의 표준생산이 이뤄지지 않아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원시적인 초급단계였다. 이러한 상황은 1984년 개혁개방으로 외국자본이 유입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중국 자동차 2.0시대:합자의 그늘 아래
2.0시대, 중국은 개혁개방 중 자동차산업에 가장 먼저 외국합자방식을 도입했다. 목적은 하나, 시장과 기술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자동차산업의 합자와 개방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부품시스템은 훗날 3.0시대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고 중국 자동차시장의 높은 경쟁기준도 마련되었다.
외국과의 합자를 통해 중국 자동차업체의 생산 및 제조기술이 향상되고 산업체인이 형성되어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합자의 2.0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중국 자동차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긴 했으나 합자의 강력한 기능으로 시장에서 점차 소외되어 갔다.
그러나 이 시기의 중국 자동차공업 역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시장과 기술을 교환한다는 목표가 과도하게 이상화된 것이다. 합자생산으로 중국 자동차산업이 수공업모방의 1.0시대에서 공업화 생산의 2.0시대로 들어서고 생산제조기술력과 부품의 국산화율이 크게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합자생산을 통한 이윤이 전부이다 보니 합자기업인 중국의 대형 자동차 국유기업들이 시장점유율도 낮아지고 기술도 얻지 못하는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합자에 참여한 모든 중국기업들이 기업의 이윤을 주로 합자에 의존하는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베이징자동차(北汽, 베이치)의 경우 이윤의 절반이 베이징현대에서 창출되었다. 그 결과 정말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던 중국 자동차기업은 오히려 약화되고 자체개발을 아예 포기하고 합자기업을 통한 이윤에 만족하는 기업까지 생겨났다.
중국의 대형 자동차 국유기업은 최소한의 국산자동차 판매로도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었고 합자자동차의 이윤으로 직원들의 27개월치 급여를 해결하면서도 국산자동차와 자체개발에 대한 투자는 극히 적은 국유기업도 있었다. 합자의 처음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합자에 대한 희망이 커지면서 ‘종이(계약서) 한 장으로 평생 써먹는’ 식으로 계속해서 팔려나가기를 바라는 대형 그룹들이 늘어났다.
합자의 대상이 많을수록 판매 량이 늘고 위험은 줄며 이윤이 높아져 중국 국유 자동차기업들은 거물급 다국적기업 하나로 모자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합자를 확대하였다.
이렇게 합자 자동차들이 중국으로 밀려 들어오자 중국 자동차는 원래의 명성을 잃어갔다. ‘상하이’는 산타나(Santana)에서 생산에 들어간 후 생산중단을 선언해 몇 십 년 생산이 중단 되었고, ‘홍치’는 아우디의 기술을 도입하고 링컨의 디자인을 활용해 도요타(Toyota) 차량 특정모델의 중국 판이 되었다. 국유기업으로 대표되는 중국 자동차는 거의 전멸되어 일부 저급한 모델만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합자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합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중국 자동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자국 브랜드 없이는 중국 자동차의 미래도 없다.
중국 자동차 3.0시대:민영기업의 급성장으로 명예회복
합자가 확대되면서 민영 자동차기업은 공룡시대 최하층에서 생활하던 포유류처럼 ‘대세’는 아니었지만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시도가 처음 이뤄졌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다. 창청(长城), 지에리(吉利), 비야디(比亚迪) 등의 대표적인 민영 자동차기업이 부흥,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자동차업계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초기에는 막막함도 있었지만 곧 빠른 속도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걸었던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중국 자동차는 이미지가 좋지 않아 역으로 속칭 ‘짝퉁’을 개발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외국기업의 소송도 많았다.
그러나 대형 국유기업과 달리 퇴로가 없던 민영기업은 당시 시장의 수요에 따라 중국실정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밖에 없었다. ‘QQ’로도 불리는 지방국유기업 체리(奇瑞)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많은 가정이 처음으로 구매하게 된 자가용이 되어 ‘QQ’의 원형인 쉐보레(Chevrolet)가 궁지로 몰렸다.
이에 이어 ‘창정’은 SUV 하발H3로 중국 국내시장에서 오늘날의 입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비야디F3’의 성공으로 절정에 달한다. 중국 자동차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은 저렴한 가격, 동급차량 중 가격이 가장 낮다. 자동차의 보급으로 3.0시대의 중국 자동차는 저렴한 제품으로 가장 크게 각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 중국 자동차의 정체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이다. 민영기업의 발전과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중국 국유기업의 지도자들은 자동차산업 ‘11차 5개년계획(十一五规划)’에 대해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는 대형 자동차 국유기업의 ‘중국 자동차산업 개조’프로젝트에 참여로 이어졌다.
국유기업의 투자규모가 민영기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분명한 현실인 만큼 기업인수, 기술매입, 브랜드구매, 플랫폼구매, 국유기업 R&D센터 설립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영기업이 걸었던 과정을 밟는 데 박차를 가했다.
그 성과는 놀라웠다. 창안자동차(长安汽车)총재 주화룽(朱华荣)은 인터뷰에서 “국유기업의 효율이 더 낮았더라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쌓이면 결국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현재 중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수년 전 대기업들이 개발, 투자한 결과라고 덧붙었다.
국유기업의 투자효과로 중국 자동차의 이미지가 개선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민영 자동차기업 역시이에 뒤지지 않고 새로운 자동차를 끊임없이 출시하면서 중국 자동차는 판매량 선두권을 지키고 있다.
“아직도 합자방식의 ‘젖’을 먹으며 높은 이윤을 누리는 대형 자동차기업들이 있는데, 중국의 자동차공업 발전은 민영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비야디’ 왕촨푸(王传福)사장의 말이다.
이렇게 중국 자동차는 3.0시대 들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저작권자ⓒ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
많이본 기사
- 경제
- 사회
- 도시